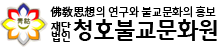서울 길상사 관음보살상
서울 길상사 관음보살상
1. ‘메멘토 모리’는 자기탐구(자기발견)의 화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명언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연유와 관련이 있어서일까 정작 내가 누구인지 자문하면 할수록 어렵고 묘연하게만 느껴진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또 종국에는 '어디로 가는지'와 같은 의문은 참으로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물음이라 그 답을 찾기가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탄생이나 죽음(生死)과 같은 현상들은 때때로 우리를 마치 아득한 深海 속으로 데려다 놓기라도 하는 것만 같다. 특히 가까운 주변 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순간에는 생을 마감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더 강한 두려움과 강렬한 의문에 빠져들게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나의 탄생 전에는 나는 어디에 있었고, 존재하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도 현 세상은 여전히 지금처럼 존재하게 되는지 이 몸뚱이는 사라지겠지만 내 영혼만큼은 어떤 미지의 세계나 혹은 천국의 하늘나라로 흡사 여행이라도 떠나듯 어디론가 가는지 등등 이런 궁금증들을 불러일으키며 기대 반 불안 반으로 전생 또는 사후세계의 모습을 그려보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의문들은 평소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생각(질문)의 소재로 잘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마도 이런 유형의 자기물음들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욕구 충족(만족)과는 직접 연결되지도 않고 또 어떻게 그 해결의 길(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세상의 온갖 잡다한 질문들에 대해서조차 옳든 그르든 척척 그 답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챗 GPT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인지'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며 스스로 그 답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걸까? (달리 표현하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런 질문들이 일상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일상에서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란 고사성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 구절 속에 함축된 의미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인간이 인간(자신이나 타인)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속담도 그래서 생긴 것이리라! 하지만 대게의 경우 평소에는 보통의 凡夫 들조차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 만큼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믿고 막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파고들면 들수록 여간 만만한 질문이 아님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심도 있는 자기(마음) 탐구를 위해서는 난해하다고 해서 그런 질문들을 묵과할 수도 없고 또 비켜 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