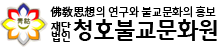등은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
 남원 실상사 석등(고복형)
남원 실상사 석등(고복형)
등은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
등(燈)이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하여 불을 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시대에는 등을 만드는 재료나 형태 또는 쓰임새에 따라 여러가지 명칭으로 일컫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등잔(燈盞)이다. 기름을 용기에 담고 실을 꼬아 만든 심지를 이용하여 불을 밝힌다. 그릇의 재료에 따라 토기, 도기, 자기, 옥석(玉石) 등이 있으며, 형태에 따라 종지형, 호형(壺形), 탕기형(湯器形)으로 나눌 수 있다. 기름은 식물성 기름(참기름·콩기름·면실유·피마자기름 등)과 어유(魚油), 경유(鯨油), 굳기름 등을 사용한다. 등경(燈檠)이 있으니, 이는 등잔을 적당한 높이에 얹도록 한 등대(燈臺)로서 흔히 등경걸이라 부른다. 등잔과는 별도로 만드나 등잔에 긴 대를 붙여 만든 것도 등경이라 한다. 다음으로 촛대가 있다.
초를 꽂아 불을 밝히는 등기(燈器)로 기본형식은 받침대와 간주(竿柱) 그리고 초꽂이가 달린 받침으로 이루어진다. 이 촛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례나 혼례 또는 연회 등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의식에서는 대개 쌍으로 사용하며, 대형 촛대는 2미터가 넘는 것도 있다. 또 제등(提燈)이란 밤길을 가거나 의식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등기(燈器). 초롱·등롱·청사초롱·조족등(照足燈)·조촉(照燭) 등이 있다. 괘등(掛燈)은 벽이나 들보에 거는 데 주로 외등(外燈) 양식으로 제등과 비슷한 형태나 구조를 지녔으나 크기가 큰 것이 특징이다. 한편 사찰에서 불전의 앞에 세우는 돌로 된 등을 광명대(光明臺)라 한다. 한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무덤 앞에 세운석 등을 장명등(長明燈)이라 한다.
이러한 여러 등 가운데 형태미나 상징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불전(佛殿) 앞에 놓여 있는 석등을 첫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 석등이란 글자 뜻 그대로 돌로 만든 등을 일컫는 말이다. ‘석등’이란 명칭은 891년(신라 진성여왕 5)에 건립된 개선사지석등(開仙寺址石燈, 보물 제111호)에 새겨진 ‘건립석등(建立石燈)’이란 명기(銘記)에서 볼 수 있는데, 현존하는 기록 가운데 가장 앞선 자료이다. 이밖에도 1093년(고려 선종 10년)에 건조된 나주서문석등(羅州西門石燈, 보물 제364호)에 새겨진 명문에는 ‘등감일좌석조(燈龕一座石造)’란 표현이 보인다.